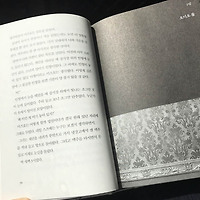브레이크 다운 - B.A. 패리스
소설의 제목인 '브레이크 다운(break down)'은 '고장'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, 나아가 'nervous break down'은 신경쇠약을 가리킨다. 굉장히 직설적인 제목이다.
교사 일도 즐겁고, 사랑하는 남편도 둔 완벽한 생활을 보내는 캐시. 하지만 그녀에겐 남 모르는 '불안'이 있다. 자신의 엄마처럼 언젠가 치매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.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좀 이상하다. 친구에게 주기로 한 생일선물이 기억나지 않고, 이웃 부부를 초대한 것도 깜빡한다. 거기다 얼마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, 차창 밖으로 보았던 여자가 다음 날 시신으로 발견되고,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는 수상한 전화까지 걸려온다. 갑자기 날아든 공포와 스트레스, 의심. 자신도 믿을 수 없고, 가족도 친구도 의심스럽고, 혼란스럽기만 한데….
거짓말 1도 안 하고, 딱 돌아버릴 것 같았다.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심장이 쫄깃하거나 가끔 소오름이 돋거나 한 경험은 물론 있다. 하지만 읽는 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책은 처음이었다. 200쪽을 넘겨도 '~일 수도 있다', '그럴 지도 모른다', '거짓말을 했다'와 같은 의심과 거짓의 텍스트가 난무한다. 주인공이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상황에 몰리는 동안, 내 머리도 온전치 못한 기분이다. 하지만 주인공 캐시가 우연히 손에 넣은 검정 휴대폰을 손에 넣은 순간, 분위기는 단번에 반전된다. 그동안의 고구마 전개는 뒤로하고, 스토리가 가파르게 치고나간다. 그게 놀랍고, 또 재밌다. 특히 긴 줄글이 '문자 메시지 형식'으로 바뀌면서 텍스트 양도 짧아져 속도감도 느껴지고, 무엇보다 생생하게 느껴져 읽는 맛이 몇 배는 솟는다. 완벽한 페이지터너.
초중반까지 읽으면서 '주인공=나' 같은 기분이 들어서 힘들었던 것 외에 아쉬운 점을 꼽자면, '치정' 결말. 원래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서 '치정'도 재밌게 읽는 타입인데, 전작이 <비하인드 도어>였던 걸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. <브레이크 다운>도 푹 빠져서 며칠을 보낼 만큼 재밌었지만, 만약 후속작에서도 비슷한 스토리라인을 가져간다면 작가의 다시 보게 될 것 같다. '이 작가는 이런 반전 말고는 없는 걸까?' 하고. 아직까지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걸로!
'책 > 리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《기린의 날개》 - 히가시노 게이고 (3) | 2018.09.14 |
|---|---|
| 《포이즌 도터 홀리 마더》 - 미나토 가나에 (0) | 2018.08.25 |
| 《십자 저택의 피에로》 - 히가시노 게이고 (0) | 2018.08.05 |
| 《누구》 - 아사이 료 (0) | 2018.08.05 |
| 《작지만 확실한 행복》 - 무라카미 하루키 (0) | 2018.07.17 |